푸른샘
11/29 복숭아밭을 보러 간 날 Re:아름다운 묘지
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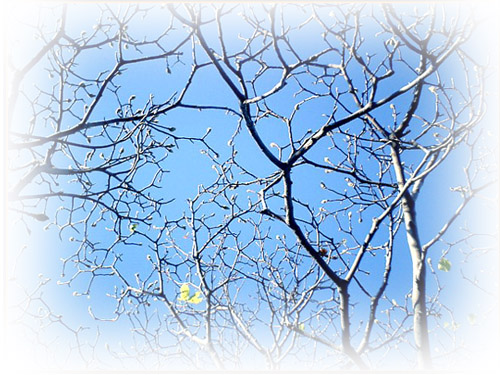
11/29 복숭아밭을 보러 간 날
두어 해 동안 조석으로 나가서 정을 붙이던 텃밭을 여의고 난 후 한참동안은 참 홀가분하였다. 그동안 함부로 받던 햇살을 피하게 되니 얼굴도 조금 하애지고 시간도 많이 여유로워진 것이다. 그러나 대신 문득문득 밭을 잃은 여자의 적적함이 탈이었다. 겨우 뒤안의 놀이터 모래밭 곁에 작은 상추밭을 만든 것이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손바닥만한 그곳에 잘 자란 적상추 사이로 시금치랑 보리씨까지 비집고 뿌려두었더니 그것들도 눈을 뜨고 꼬물꼬물 자라서 제법 예뻤다.
오늘은 주말 아침이라 가까운 해남 달마산에 등산이나 갈까 꿈꾸고 있는 차에 잘생긴 땅 하나 났다고 연락이 왔다. 산소 자리로 쓸 곳을 구한다고 부탁해두었던 곳이다. 아침 생식을 한 잔 마시고 바로 나서서 그곳을 향하는데 마음은 내내 어머니 생각이었다. 그 땅이 있는 곳이 우리 어머니의 고향인 나주 지나서 금천, 노안이라니까 더욱 그렇다.
어머니는 항상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면 복숭아와 명태 그리고 엿을 들었다. 본래 복숭아 과수원을 가지고 있던 친정에서 실컷 잡수던 복숭아는 앉은자리에서 한 관이라도 드실 수 있다고 호언을 하시곤 했다. 분홍빛 도는 우윳빛 껍질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백도는 손톱으로 껍질을 벗기면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연하고 보드라운 속살이 입안에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이다. 그런 백도는 잠시 철을 따라 나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잽싸게 구하지 않으면 먹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굉장히 비싸다.
아이들 어릴 적 그런 전주 백도를 한 관 사놓고 학교에 다녀오면 낮 동안에 다 없어지곤 하였다. 나는 복숭아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적잖이 드시는 걸로 알았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우리 애들 둘 다 그 복숭아 호랑이였다. 한 관이라야 열 두어 개 밖에 안되니 어머니는 손톱 아프게 벗겨주시기만 했지 아마도 애들 입으로 홀랑 들어갔으리라.
우리 애들이 좀 자라자 손을 털고 광주로 가신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적적함으로 잠시 나주의 큰 황도 통조림 공장에 다니셨다. 심심해서 소일거리라 하셨지만 겨우 이틀을 다니고 힘이 부쳐서 그만 두셨다. 그러나 그 일을 듣고 난 빙긋 웃으며 "엄마 복숭아는 많이 드셨소?" 하였다. 후에 생각하니 부족한 용돈 벌이를 하려고 동네 아낙들을 따라서 고향 부근인 그 간스메 공장에 일하러 가신 것을... 깊이 생각할수록 마음이 짜안하다.
얼마 전 부시의 부인이 나주까지 와서 나주 배 맛을 보고서 흠뻑 칭찬하고 간 뒤 배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한다. 그래서 배농사를 장려하니 모두 복숭아나무를 베어내고 배 농사로 전환하여 나주엔 복숭아밭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배의 수확이 과잉되는데다가 배 과수는 일도 많아 품이 들고 값도 헐해졌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 배가 위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 도리어 베어내 버린 복숭아가 귀해서 나주 황도 통조림 공장에 진짜 나주 황도가 5%에도 못미친다 한다.
老安이라는 편안한 이름의 동네는 역시 배와 복숭아 과수로 유명하다. 큰길가에서 5분쯤 들어간 석정 마을 안에 네모 반듯한 천 평의 복숭아밭은 이제 두 돌을 갓 넘겨 나지막이 내 겨드랑이 아래 차는 작은 복숭아나무가 오십 여 주 심겨있고 그 바닥으로는 아름드리 김장 배추가 알지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빙 한번 둘러보니 가을 들판이라 호젓해 보이지만 저만큼 둘러친 병풍산은 금정산 자락이고 풍수도 좋은 곳이다. 주변의 배나 포도 과수원도 어우러져서 봄이 되면 아늑하고 몹시 아름다울 듯하다.
그러나 그는 산소자리론 적합지 않는 서향이라고 퇴치고 만다. 서향이라지만 거의 경사 없이 펀펀한 들판 한 가운데라 별 탈 없을 듯한데 그런다. 나는 그 작고 아담한 복숭아나무에 밥풀처럼 조랑조랑 맺힐 복숭아꽃들이 벌써 그립고 애틋한데. 그리고 요즘 과수들은 조숙해서 곧장 훌쩍 자라서 복사꽃 흐드러지는 황홀한 桃花園을 이룰텐데... 나무 사이로 남아있는 빈땅에는 감나무나 살구나 자두나무를 더 심을 수도 있을 게다. 너른 바닥에는 이런저런 갖가지 채소를 심을 생각도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오는 길에 밭주인이 사는 동네 가운데를 지나며 보니 신숙주 생가를 복원하는 공사판도 벌어지고 사당과 제각도 있어 이제는 퇴락해버린 유림의 서글픔이 묻어난다. 어머니의 고향 가까운 곳이라서 마음이 부르는 듯하지만 땅이란 또 얼마만한 큰 인연이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잖던가. 피가 부르듯 이끌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땅과의 연이라 한다. 나는 돌아서오며 혹시나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없나 몇 번이고 두리번거렸다.
마침 시간을 낸 큰 애을 만나서 무등산 아래서 점심을 먹었다. 푸짐한 찬으로 꾸민 보리밥은 항상 과식하게 한다. 그래서 속이 불편하다고 빠지자 부자는 함께 톱을 들고 산에 들어가 산소의 대를 벤단다. 이제 산소 돌보는 일을 당연히 아는 큰아들이 대견하다. 차에 남아서 라프마니노프 피아노를 들으며 곽재구의 책을 읽다가 산소 부근에 떨어진 똘갓을 캐려 올라갔다. 항시 누군가의 등을 보며 따라 오르던 길을 혼자 걷자니 몹시 호젓하다.
숲 속 길은 발목까지 차는 댓잎과 상수리, 갈참나무 잎으로 푹신하다. 백토가 드러난 오르막길을 오르며 이걸 퍼다가 유기 그릇을 닦았다는 시어머니 말씀이 기억난다. 저기 소나무 아래 5대조 할아버지 묘가 있다했지. 지난 번 초록색 무잎이 무성하던 그 너른 밭은 다 갈아엎어진 채 황토로 덮인 무 움집만이 드높다. 대는 겨울이 되어도 마냥 청정한데 아들과 아버지는 벌써 상당히 너르게 벌목을 해놓았다. 청대가 우르르 쓰러지는 것은 바람 한 짐 부리는 일처럼 스산하지만 식구들이 산소에서 노는 일은 오붓하고 흐뭇하다.
저녁엔 산소 가에서 거둬온 갓과 무우로 나박김치를 담궜다. 이상하게도 없는 솜씨지만 어머니의 손맛이 남아선지 동치미나 물김치만은 잘 되었다. 노안의 복숭아밭이 내게 온다면 밭 안에 시어른 두분을 합장해서 모시고 작은 황토집도 지을 것이다. 어머니가 계신 망월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묘막을 지킬 것이다. 진홍색 복숭아꽃 만발한 봄부터 김장 배추 실팍하게 자라는 겨울까지... 나의 2차 농경시대는 훨씬 조직적으로 잘 될 것같다는 꿈에 부플어서 자리에 들었다.
2003.12.1
| | |